독서추천
리뷰
김영석 2014-11-27
추천(0)
조지 오웰의 디스토피아
소설 1984를 읽은 뒤 이 소설이 왜 문학사에 길이 남는 작품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다. 조지 오웰이 예측한 1984년의 세계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개인의 자유가 억압받고 모든 권력은 한 사람을 향하는 전체주의 사회이다. 그런데 이 믿을 수 없는 독재 정권의 상황이 과거의 우리, 그리고 현재의 우리와 닮아있고, 미래의 우리와도 닮아있을 것 같아 섬뜩하다. 최근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작품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국민이 국가에 관심이 없다면 국가는 건강할 수 없다. 작가가 소설을 탈고한 1948년으로부터 작품 속 배경인 1984년까지 36년이 지났고 또 그 뒤로 현재까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소설의 내용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언어를 줄이는 '신어'사업이다. 작품 속 정권은 권력에 저항하는 당에게 불필요한 단어 자체를 삭제하고 세상에 없는 단어로 만들어 버린다. 후세의 아이들은 정신교육으로 인해 당에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만, 설령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 해도 그것을 표현할 글자가 없는 상황에 처한다. 생각은 점차 단순해지고 그 표현은 점차 획일화된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노동자들을 멸시하지 않았다. 장차 언젠가 생명을 불어넣고 세계를 재생시킬 숨어있는 힘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내부는 굳어있지 않았다."
p.205
소설의 내용에서 가장 인상깊었던 부분은 언어를 줄이는 '신어'사업이다. 작품 속 정권은 권력에 저항하는 당에게 불필요한 단어 자체를 삭제하고 세상에 없는 단어로 만들어 버린다. 후세의 아이들은 정신교육으로 인해 당에 반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지만, 설령 그러한 마음을 품는다 해도 그것을 표현할 글자가 없는 상황에 처한다. 생각은 점차 단순해지고 그 표현은 점차 획일화된다.
"그는 생전 처음으로 노동자들을 멸시하지 않았다. 장차 언젠가 생명을 불어넣고 세계를 재생시킬 숨어있는 힘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노동자들은 인간성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내부는 굳어있지 않았다."
p.205
정봄비 2014-11-05
추천(0)
사람의 바닥을 보다
고등학교 때 국어교과서에서 '1984'의 발췌된 글을 읽고 꼭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조지 오웰과 1984, 이 두 단어는 듣기만 해도 중압감을 느끼게 한다. '멋진 신세계'처럼 사람들의 경계를 꾀하는 책이라서 그런 것일까, 나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비참한 결말이 다가올 거란 느낌이 들었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깊었고, 슬프게 느꼈던 것은 윈스턴과 줄리아의 변화였다. 감정과 사상, 더 나아가 개인의 성욕마저 통제하는 절대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 그 둘은 갈기갈기 찢긴 자유를 방패삼아 은밀한 사랑을 나눈다. 억압의 상징인 빅브라더를 자유로이 비판하며 애정을 속삭이던 그 둘은 모든 것이 발각되자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굶주린 쥐들이 담긴 상자를 윈스턴의 얼굴에 가져다대자 그가 한 말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 줄리아한테 하세요! 줄리아한테! 제게 하지 말고 줄리아한테 하세요! 그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도, 살갗을 벗겨 뼈를 발라내도 말예요. 저는 안 돼요! 줄리아한테 하세요! 저는 안 됩니다. "
간수에게 붙잡혀 서로를 무심히 스쳐지나가던 윈스턴과 줄리아는 서로에게서 과거의 애정어린 눈빛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치욕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
윈스턴은 그가 봐왔던, 빅브라더에게 저항한 이들처럼 죽어갔다. 윈스턴의 외침은 '인간'의 죽음이었다. 인간의 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을 낱낱이 보이며 죽어가야 했던 '자유'의 죽음이었다.
내가 이 책에서 가장 인상깊었고, 슬프게 느꼈던 것은 윈스턴과 줄리아의 변화였다. 감정과 사상, 더 나아가 개인의 성욕마저 통제하는 절대주의 국가 오세아니아에서 그 둘은 갈기갈기 찢긴 자유를 방패삼아 은밀한 사랑을 나눈다. 억압의 상징인 빅브라더를 자유로이 비판하며 애정을 속삭이던 그 둘은 모든 것이 발각되자 완전히 달라져버렸다.
굶주린 쥐들이 담긴 상자를 윈스턴의 얼굴에 가져다대자 그가 한 말이 모든 것을 보여준다.
" 줄리아한테 하세요! 줄리아한테! 제게 하지 말고 줄리아한테 하세요! 그 여자한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어요. 얼굴을 갈기갈기 찢어도, 살갗을 벗겨 뼈를 발라내도 말예요. 저는 안 돼요! 줄리아한테 하세요! 저는 안 됩니다. "
간수에게 붙잡혀 서로를 무심히 스쳐지나가던 윈스턴과 줄리아는 서로에게서 과거의 애정어린 눈빛을 떠올릴 수 있었을까?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과 치욕이 기다리고 있다면 어떨까.
윈스턴은 그가 봐왔던, 빅브라더에게 저항한 이들처럼 죽어갔다. 윈스턴의 외침은 '인간'의 죽음이었다. 인간의 바닥까지 떨어진 모습을 낱낱이 보이며 죽어가야 했던 '자유'의 죽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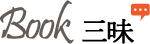



 북삼매광장
북삼매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행사일정/신청
행사일정/신청 나의 독서활동관리
나의 독서활동관리 나의 독서이력관리
나의 독서이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