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추천
나를 움직인 한권의 책
리뷰
우태한 2017-02-21
추천(1)
내 비석에는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마침”이라고 적히길.
내 비석에는 “나 자신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마침”이라고 적히길.
어른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내가 그동안 어른이라고 여겨왔던 어른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너는 무엇을 되고 싶니?’. 그리고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자신이 있었던 편이다. 그 대답을 할 준비가 되었었으니. 그런 만큼 나 또한 누군가에게 물었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그리고 그러한 물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가 그의 대답을 듣고 그를 파악했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모두 곁다리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어른이 아니었고, 나에게 질문을 던진 그들도 어른이 아니었다. 스스로 무엇인가 원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 모르는 나이 많은 어린애에 불과했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것만큼이나 현재의 삶에 비해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한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는 정도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는 의미이다. 물론, 반성하는 것이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듯, 미래를 꿈꾸는 것이 현재를 번성시킬 것이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현재를 위한다는 핑계로 희생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과거에 그렸던 우리의 삶과 현재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도서관에 A라는 책을 빌리러 갔다가 B라는 책을 빌려온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 불가항력을 무시한 채, 우리는 미래의 꿈을 위해 현재에 대한 아무런 관조도 없이 ‘맹목적으로’ 희생한다. R=VD를 외쳐가며. 니체는 이러한 삶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우리 문명은 평온의 결핍으로 인해 새로운 야만 상태로 치닫고 있다. 활동하는 자, 그러니깐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관조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인간 성격 교정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찰의 부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곁다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인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새 사회는 곁다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에 도로를 두고 닦아 더 이상 지름길이 아닌 인생의 길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묻고 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이런 물음에 질려올 때쯤.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깨달을 쯤. 꿈이 뭐냐고 묻기보다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혹은 취미가 뭐냐고 묻는 것이 더 좋아지던 와중에 ‘데미안’도 만났다. 그리고 나는 추상적이던 혹은 피상적이던 내 생각을 구체화하고 내 삶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엔 나약하기에.
소설 데미안 속 주인공은 그 나름의 깨달음을 얻은 후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의 삶은 제각기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의 시도이며, 좁은 오솔길을 가리켜 보여주는 일이다. (…)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소명이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그것뿐이다. 시인, 범죄자,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며, 결국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세상의 형태는 변하고 있고, 세상에 내재된 의미들 또한 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속에 던져진 우리 자신의 본질뿐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깨닫길 원하고 있다. 수많은 적성검사와 대상자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물론 그 적성검사가 직업을 알려주는 지표로써 작용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개성을 좁게 보고, 나와 남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되어 버린 사회 속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획일화되어 계급화된 사회 속의 자신을 소속시켜버려 자존감이란 것조차 상대적으로 만들어 스스로가 상대성을 띄어버리게 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자연 속에 던져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일이지 않을까?
존 윌리엄스의 팩션 ‘아우구스투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늙음 배우처럼 너무 많은 역을 맡은 탓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일 수 없는 거야.”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것은 너무 많은 역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역이 자기 자신 그 자체인 것이라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또한 많은 역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는다. 정체성혼란. 하지만 이 정체성혼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닐까. 현재에 대한,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한 관조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본질에 대해, 나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을 내려주는 책’을 꼽으라면, ‘나 자신을 철학자로 이끈 책’을 꼽으라면 책 중 데미안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어른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나에게, 시간이 흘러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내가 그동안 어른이라고 여겨왔던 어른들이 이런 질문을 한다. ‘너는 무엇을 되고 싶니?’. 그리고 나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에 자신이 있었던 편이다. 그 대답을 할 준비가 되었었으니. 그런 만큼 나 또한 누군가에게 물었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그리고 그러한 물음이 누군가에게 들어가 그의 대답을 듣고 그를 파악했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는 스스로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모두 곁다리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었다.” 돌이켜보면 나는 어른이 아니었고, 나에게 질문을 던진 그들도 어른이 아니었다. 스스로 무엇인가 원하면서도 무엇 때문에 원하는지 모르는 나이 많은 어린애에 불과했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는 것만큼이나 현재의 삶에 비해 무의미한 일이라 생각한다. 미래를 꿈꾸는 것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반성을 하는 정도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하는 의미이다. 물론, 반성하는 것이 현재의 삶을 풍요롭게 하듯, 미래를 꿈꾸는 것이 현재를 번성시킬 것이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현재를 위한다는 핑계로 희생하고 있다.
시간이 흘러 되돌아보면, 과거에 그렸던 우리의 삶과 현재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도서관에 A라는 책을 빌리러 갔다가 B라는 책을 빌려온 적이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미래의 불확실성, 예측불가능성, 불가항력을 무시한 채, 우리는 미래의 꿈을 위해 현재에 대한 아무런 관조도 없이 ‘맹목적으로’ 희생한다. R=VD를 외쳐가며. 니체는 이러한 삶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 ‘우리 문명은 평온의 결핍으로 인해 새로운 야만 상태로 치닫고 있다. 활동하는 자, 그러니깐 부산한 자가 이렇게 높이 평가받는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따라서 관조적인 면을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인간 성격 교정 작업 가운데 하나이다.’
현재에 대한, 인생에 대한 고찰의 부재를 두고 살아가는 삶은 곁다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인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어느새 사회는 곁다리의 삶을 살아가는 지름길에 도로를 두고 닦아 더 이상 지름길이 아닌 인생의 길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묻고 있다. “너는 무엇이 되고 싶니?”라고.
이런 물음에 질려올 때쯤. 무엇이 되고 싶은지 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깨달을 쯤. 꿈이 뭐냐고 묻기보다 평소에 무엇을 하는지 혹은 취미가 뭐냐고 묻는 것이 더 좋아지던 와중에 ‘데미안’도 만났다. 그리고 나는 추상적이던 혹은 피상적이던 내 생각을 구체화하고 내 삶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스스로 어떤 것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엔 나약하기에.
소설 데미안 속 주인공은 그 나름의 깨달음을 얻은 후 이렇게 말한다. “모든 사람의 삶은 제각기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의 시도이며, 좁은 오솔길을 가리켜 보여주는 일이다. (…)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진정한 소명이란 오직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것, 그것뿐이다. 시인, 범죄자, 미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며, 결국 그리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고. 세상의 형태는 변하고 있고, 세상에 내재된 의미들 또한 변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 속에 던져진 우리 자신의 본질뿐이다. 우리는 자신에 대해 깨달아야 한다. 지금도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깨닫길 원하고 있다. 수많은 적성검사와 대상자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물론 그 적성검사가 직업을 알려주는 지표로써 작용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개성을 좁게 보고, 나와 남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되어 버린 사회 속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획일화되어 계급화된 사회 속의 자신을 소속시켜버려 자존감이란 것조차 상대적으로 만들어 스스로가 상대성을 띄어버리게 된 자신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자연 속에 던져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유의미한 일이지 않을까?
존 윌리엄스의 팩션 ‘아우구스투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 “늙음 배우처럼 너무 많은 역을 맡은 탓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일 수 없는 거야.” 아우구스투스가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던 것은 너무 많은 역을 맡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역이 자기 자신 그 자체인 것이라 여기고 살아왔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 또한 많은 역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는다. 정체성혼란. 하지만 이 정체성혼란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닐까. 현재에 대한, 세상에 대한, 자신에 대한 관조의 부재로 인해 자신의 본질에 대해, 나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을 내려주는 책’을 꼽으라면, ‘나 자신을 철학자로 이끈 책’을 꼽으라면 책 중 데미안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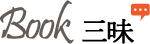



 북삼매광장
북삼매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행사일정/신청
행사일정/신청 나의 독서활동관리
나의 독서활동관리 나의 독서이력관리
나의 독서이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