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추천
나를 움직인 한권의 책
리뷰
이정민 2014-05-29
추천(2)
시는 읽는 사람의 것
이 책은 칠레의 시인 네루다와 그의 우편배달부였던 마리오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다. 칠레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는 대조적인, 아픈 역사의 한 조각도 함께 그려진다. 서문에서 언급하듯이, ‘열광적으로 시작해서 침울한 나락으로 떨어지며 끝을 맺는다.’
세계적인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스카르메타의 소설 속에서 보다 더 유쾌하고 친근한 시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우편배달부인 마리오의 연애를 위해 직접 전화를 걸고 시를 써주기도 한다. 일자리를 구하라는 아버지의 독촉에 못 이겨 우편배달을 시작하는 마리오가 네루다를 통해 시에 대해, 메타포에 대해 눈을 뜨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네루다의 시 낭송을 들으며 마리오는 '단어들이 바다처럼 움직였'음을, 자신이 '말들 사이로 넘실거리는 배'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온 세상이 다 무엇인가의 메타포’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린 마리오처럼 ‘혀까지 치고 올라와 이빨 사이로 폭발하려는 환장할 심장 박동’을 느끼게 된다. 사랑하는 베아트리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마리오는 어느새 네루다의 시를 인용해 사랑 고백을 하고,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에요!’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 그가 파리로 떠난 네루다를 그리워하며 그들이 함께 거닐던 이슬라 네그라의 아름다운 소리를 녹음하는 장면은, 그리움의 끝에서 마침내 시인이 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란, 메타포란 무엇일까. 가끔 우리 가슴을 치며 지나가는 질문에 이 책은 가볍게, 그러나 가볍지만은 않게 하나의 답을 들려준다. ‘온 세상이 다 메타포’임을 상상하는 마음, ‘시는 읽는 사람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마음이야말로, 문학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결정적 한 마디,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에요!’
세계적인 시인 파블로 네루다는, 스카르메타의 소설 속에서 보다 더 유쾌하고 친근한 시인으로 다시 태어났다. 그의 우편배달부인 마리오의 연애를 위해 직접 전화를 걸고 시를 써주기도 한다. 일자리를 구하라는 아버지의 독촉에 못 이겨 우편배달을 시작하는 마리오가 네루다를 통해 시에 대해, 메타포에 대해 눈을 뜨는 과정이 인상적이다. 네루다의 시 낭송을 들으며 마리오는 '단어들이 바다처럼 움직였'음을, 자신이 '말들 사이로 넘실거리는 배'같다는 것을 깨닫는다. ‘온 세상이 다 무엇인가의 메타포’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우린 마리오처럼 ‘혀까지 치고 올라와 이빨 사이로 폭발하려는 환장할 심장 박동’을 느끼게 된다. 사랑하는 베아트리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던 마리오는 어느새 네루다의 시를 인용해 사랑 고백을 하고,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에요!’라고 외칠 수 있게 된다. 그가 파리로 떠난 네루다를 그리워하며 그들이 함께 거닐던 이슬라 네그라의 아름다운 소리를 녹음하는 장면은, 그리움의 끝에서 마침내 시인이 된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
시란, 메타포란 무엇일까. 가끔 우리 가슴을 치며 지나가는 질문에 이 책은 가볍게, 그러나 가볍지만은 않게 하나의 답을 들려준다. ‘온 세상이 다 메타포’임을 상상하는 마음, ‘시는 읽는 사람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마음이야말로, 문학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한다.
결정적 한 마디, ‘시는 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의 것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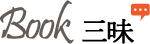



 북삼매광장
북삼매광장 공지사항
공지사항 행사일정/신청
행사일정/신청 나의 독서활동관리
나의 독서활동관리 나의 독서이력관리
나의 독서이력관리